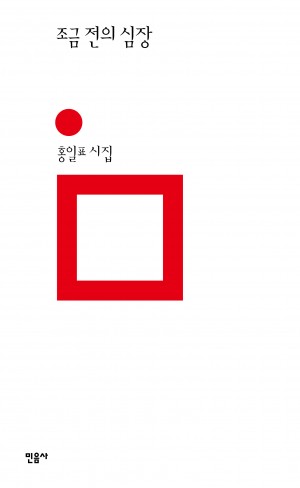눈을 감으면 선명해지는 생의 소리
비밀스럽게 고동치는 언어 바깥의 세계
홍일표 시집 『조금 전의 심장』이 민음사에서 출간되었다. 1992년 《경향신문》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한 이후 꾸준한 작품 활동을 보여 주면서 여러 시 전문지 편집 주간으로 활동해 온 홍일표 시인의 다섯 번째 시집이다.
작품 활동을 시작한 이래 줄곧 언어로 포획될 수 없는 인간 질서 너머의 세계를 좇아 왔던 홍일표 시인의 시에는 그만의 독보적인 감각과 사유로 찾아낸 신비한 요소들이 가득 차 있다. ‘구전설화’나 ‘노래’ 등 오직 소리로 전해 내려온 이야기들, ‘방언’이나 ‘불립문자’ 같은 신성의 언어를 원천으로 삼아 길어 올린 이미지와 소리 들이 그것이다. 이번 시집에서 시인이 발견한 새로운 신비의 원천은 다름 아닌 ‘몸’이다.
시인에게 ‘심장’은 몸 안에 깃든 ‘인간 질서 너머의 세계’ 그 자체이다. 『조금 전의 심장』으로 시인은 온몸의 감각기관을 활짝 열고 전에 없이 삶에 밀착된 몸짓으로 세계를 마주한다. 시인이 열어 준 길을 따라 우리는 몸과 인식의 경계를 허물어 사물이 말을 걸어오는 방식에 감각을 내맡겨 보게 된다. 그 전엔 알아채지 못했던 낯설고 매혹적인 반짝임과 그림자, 희미한 소리 들이 물밀듯 다가든다. 그렇게 우리는 생성되는 순간 사라지며 끊임없이 이어지는 언어 바깥의 소리들, 저마다의 리듬을 만들어 내는 보이지 않는 움직임을 따라 이제 조금씩 다르게 박동하기 시작하는 심장을 느끼게 될 것이다.
■ 잘 보여서 더 컴컴해진 쪽을 향해
천사와 악마의 이름이 태어났다
세계는 뚜렷해졌으나 한쪽 눈만 가진 괴물도 여럿 나타났다
잘 보여서 더 컴컴해진 날들이 이어졌다
―「검은 개」
홍일표 시인의 시에는 언어 바깥의 세계에서 발견한 작고 미묘한 반짝임과 기척으로 가득하다. 『조금 전의 심장』에서 이 반짝임과 기척은 “빛 속에서 지워지는 밀어”(「설국」), “기록되지 못하고 공중에서 흩어지는 날벌레”(「파편들」), “손끝에 잡혔다 사라지는 그림자”(「패러디」), “언어 밖으로 사라진 표정”(「여행」)처럼 알아채는 순간 사라져 버리는 존재들의 흔적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인간이 우주 만물에 이름과 의미를 부여하며 세계가 점점 뚜렷해져 간다고 믿는 동안 여전히 컴컴한 곳에 남아 있는 존재들, 미지에 속한 ‘무명의 존재’들이다. 시인은 환히 밝혀진 언어의 세계로 이들을 끌어내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이 속한 “잘 보여서 더 컴컴해진” 쪽으로 몸을 돌려 나아가며, 그들과 같은 무명의 존재가 된다. 기꺼이 자기 자신을 지우고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그 세계에 녹아든다. 깊은 어둠 속, 무명의 존재들이 제 빛을 드러내며 말을 걸어오는 곳에 도착한 시인은 이들이 각각 온전히 “혼자 남아 백야처럼 환해지는”(「낮달」) 풍경을 마침내 마주한다.
■ 눈사람의 언어로
소리를 만진다
몸으로 만지는 소리에는 거친 거스러미가 있다
울퉁불퉁한 흉터도 있다
―「발신」
이제 시인은 보는 것을 멈추고 소리에 집중한다. 도착한 곳마다 안개, 구름, 강물, 비, 바람, 파도 같은 형상들이 수시로 나타나 시야를 가로막는 『조금 전의 심장』에서 화자는 시각을 제외한 모든 감각에 집중해 세계가 말을 걸어오는 방식 그대로 감각하려 애쓴다. 오연경 문학평론가의 작품 해설에서처럼 “온몸의 감각기관을 재배치하여 세계의 감각기관과 조응”하는 방식이다. 그로부터 새로운 감각이 탄생한다. 소리는 만져진다. 소리의 “거친 거스러미”가 느껴지고 “흉터”가 보인다. 인간에게 ‘말이 되지 못한 말들’, 흔한 소음일 뿐이었던 무명의 존재들이 내는 소리는 홍일표 시인의 시를 통해 다른 감각이 되어 다가온다. 그렇게 우리는 세계의 신비를 몸으로 감각하며 그려 볼 수 있게 된다. “안개를 읽다가 죽은 이의 손을”(「겹겹」) 잡기도 하고, 이름도 기호도 없이 “숨은 얼굴”을 마주하거나 “무한으로 출렁이는 노래”(「미지칭」)를 듣는다. 『조금 전의 심장』으로 세계를 감각하는 일은 끊임없이 생성되고 사라지는 세계의 박동과 다르지 않은 내 몸의 심장 박동을 새로이 감각하는 것과 같다. 우주 만물과 함께 고동치는 ‘나’의 몸을 느끼는 일, 그 “무정형의 리듬”에 가만히 귀 기울이는 일이다.
■ 본문에서
눈을 감아 봐
빗소리를 데리고 비가 오잖아
비가 그치면
빗소리는 어디 가나
눈을 떠도
여기는 칼바위 오르는 길
조금 전의 심장
조금 전의 빗소리와 함께
―「외전(外傳)」
하늘을 날던 흰 말의 입속에서
천사와 악마의 이름이 태어났다
세계는 뚜렷해졌으나 한쪽 눈만 가진 괴물도 여럿 나타났다
잘 보여서 더 컴컴해진 날들이 이어졌다
―「검은 개」
바람불고 꿈이 희미해진다
안개가 벗겨지면서 보이는
발밑의 모래알들
이목구비가 지워진 뼈의 마지막 결심들
꿈속에서 꿈을 꾸는
이 뻔한 장난
너무 가까워서 서로가 서로를 보지 못하고 멀어진다
―「겹겹」
너는 없다
너는 느닷없이 태어나고 느닷없이 사라진다 없는 것으로 존재하는
너는 늘 수상하다
사람들은 한순간 너를 알아챈다
한 마리 새가 겁 없이 날아와 죽는 것을 보고
유리는 빠져 죽기 좋은 호수라고 말한다
돌처럼 딱딱한 허공이라고 말한다
―「유리 부족」
나는 나를 조문할 방법이 없다
몸이 없는데
검은 상복을 입은 그림자가 상주처럼 바닥에 엎드려 있다
―「저녁이 오나 봐」
멀리 떨어진 풀숲에서 너를 발견한 것은
눈 밝은 태양이었지
커다란 눈으로 너를 찾던 불붙은 심장이었지
오도카니 앉아 있는 작은 암자 한 채였어
연줄을 끊고 외진 곳으로 날아간 반달연이었어
―「모과 스님」
■ 추천의 말
홍일표 시인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문자로 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사물과 존재 들이 뱉어 내는 말, 해석되지 않고 문장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세계의 맨얼굴을 붙들어 보려는 과정을 시로 쓴다. 섬세한 관찰과 정교한 묘사는 워낙 시인의 특장이지만, 이번 시집에서는 온몸의 감각기관을 재배치하여 세계의 감각기관과 조응하려는 몸짓이 더욱 역동적이고 생생하게 살아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전의 심장』은 언어 밖에서 출렁이는 존재자들이 귀로 들은 것, 눈으로 본 것, 입으로 말한 것, 마음으로 보여 준 것을 증언하려는 시인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 오연경(문학평론가)
홍일표의 시는 인식의 체계와 그것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의 문자의 한계를 드러낸다. 문자의 한계를 드러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천사와 악마, 탄생 이야기 등 구전되는 이야기의 형식을 활용한다. 언어의 한계 속에서 돌파구를 찾아 나선 그는 문자를 초월함으로써 인식과 이성과 합리의 세계가 설정해 놓은 기본값을 전복하고자 한다.
― 박혜진(문학평론가)
■ 차례
1부
서쪽 13
설국 15
검은 강 16
증언 18
파편들 20
일식 22
외전(外傳) 24
검은 개 26
미지칭 28
겹겹 30
여행 32
발신 34
배경 36
무지개를 읽는 오후 38
2부
동백 43
수혈 45
멍 46
슬그머니 48
패러디 50
땅끝 52
낮달 54
눈사람 유령 56
육탈 — 보길도 암각시문 58
예언자 60
마네킹 62
우리 너무 확실해졌어 64
불면 66
화석 68
3부
독주 73
공회전 75
도서관 76
외경(外經) 78
극장 80
유리 부족 82
데스마스크 84
춤 86
재구성하는 너 88
녹턴 90
고물상 92
기일 94
풍선 너머 96
웃음의 기원 98
질주 100
4부
문자들 105
동사(動詞) 106
실종 108
지상의 극장 110
저녁이 오나 봐 112
서쪽의 이력 114
색 116
뿔 118
만두꽃 120
모과 스님 122
무명씨 124
모르는 사람 126
심우장을 지나다 128
등대 130
작품 해설–오연경(문학평론가) 133